시장 점유율 방어 논리로 해석하는 시각도
최근 몇 년간 생성형 AI가 급부상하면서 검색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ChatGPT, Claude, Perplexity 같은 대화형 AI가 ‘검색 대체재’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 조회뿐 아니라 심층 분석, 비교, 요약까지 AI에게 바로 묻는 시대가 열렸다.
예전처럼 무조건 구글에 검색창을 열어보던 습관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구글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AI 오버뷰(AI Overviews)’와 ‘AI 모드(AI Mode)’다. 구글은 이 기능을 “검색 경험의 최대 혁신”이라고 부르며, AI를 적용한 뒤 검색량이 늘고 클릭 품질이 좋아졌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웹사이트로 가는 트래픽이 줄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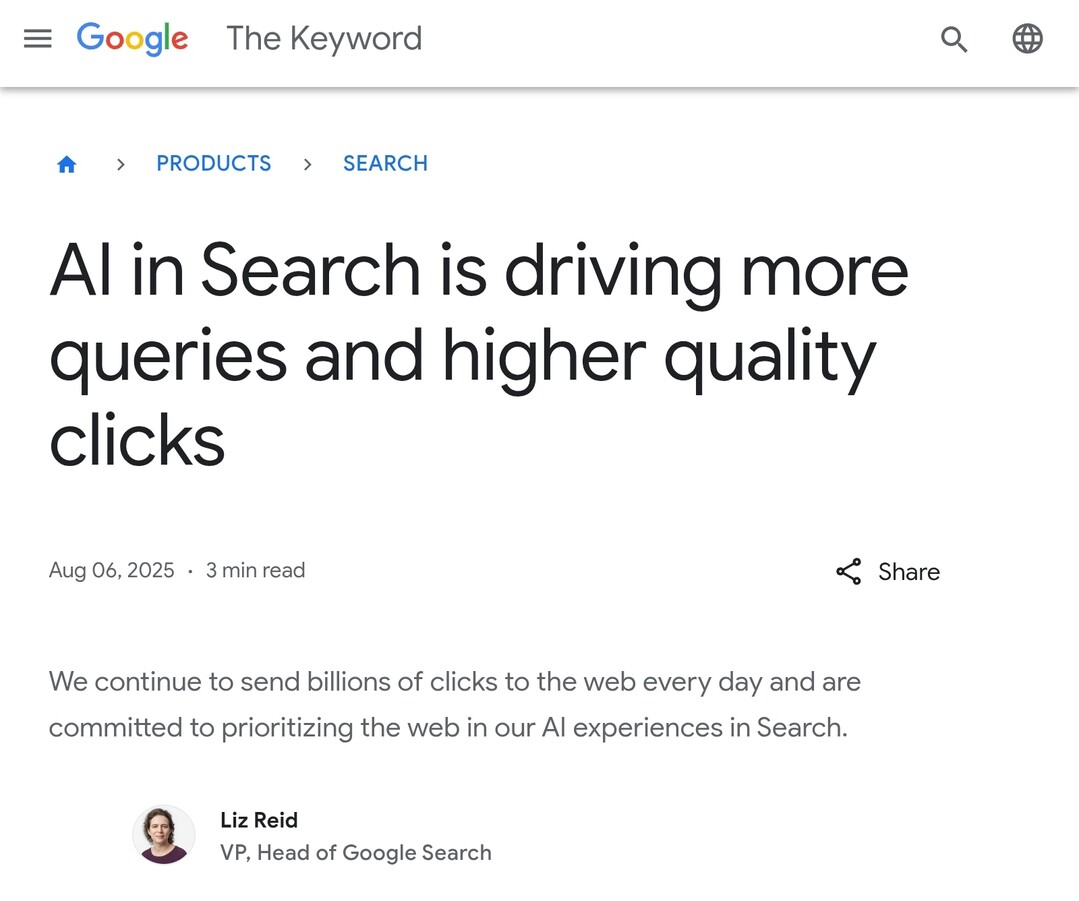
구글의 논리 – “AI는 웹의 보완재다”
구글 검색 부문 총괄 리즈 레이드는 8월 6일 공식 블로그에서 이렇게 말했다.
“AI 검색 기능 도입 이후 전체 유기적 클릭 수는 안정세를 유지했고, 클릭 품질은 오히려 높아졌다.”
그는 AI 오버뷰 덕분에 복잡하고 긴 질문이 늘었고, 페이지 안에 더 많은 링크가 노출돼 웹사이트가 보일 기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즉, AI가 기존 검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웹 생태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시각 – ‘낙관적 서사’로 점유율 방어
하지만 이 발표를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시장 데이터는 이미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구글 대신 ChatGPT나 Perplexity 같은 AI 서비스로 바로 질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상황에서 구글의 AI 검색 전략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라기보다, 빠져나가는 검색 수요를 다시 구글 내부로 붙잡아 두려는 방어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래픽 총량 유지 논리의 한계
구글이 말하는 ‘트래픽 안정’은 전체 합산 기준이다. 하지만 이 안에는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다. 기존에 뉴스·전문 정보 사이트가 받던 유입이 줄고, 대신 포럼·SNS·영상 플랫폼 쪽으로 트래픽이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플랫폼 체류 시간 늘리기
AI 오버뷰가 페이지 안에서 질문에 대한 1차 답을 제공하면, 사용자는 굳이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다. 이는 구글 생태계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광고·서비스 소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웹 생태계 다양성 훼손 가능성
구글은 AI 오버뷰에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링크를 전면 배치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노출되는 링크 수와 순서는 제한적이며, 알고리즘이 선택한 일부 사이트만 클릭 혜택을 본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 콘텐츠 제작자는 “내 콘텐츠가 AI 학습과 요약에 쓰이지만, 실제 방문자는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다. 장기적으로는 웹 생태계의 다양성이 약화되고, 정보 유통 구조가 구글 중심으로 더 고착될 수 있다.
문제의 본질 – ‘검색’이 아니라 ‘지배력’
구글은 “AI로도 웹은 살아남는다”는 메시지를 내세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기술 비전이 아니라 점유율 방어를 위한 정치적 언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경쟁의 승패는 ‘정보의 품질’보다 ‘사용자가 첫 질문을 던지는 곳’에서 갈린다.
구글이 AI 기능을 전면 배치한 이유도, 그 첫 질문을 다시 자사 플랫폼 안에서 시작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저작권자ⓒ META-X.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