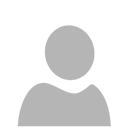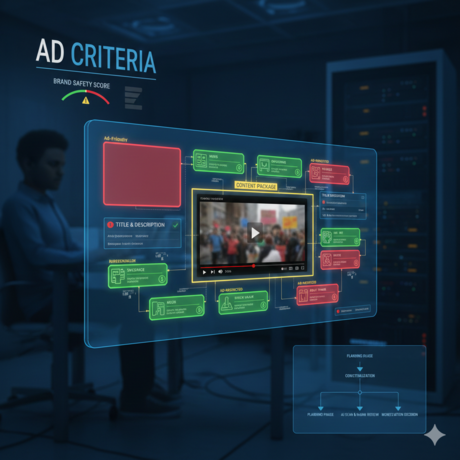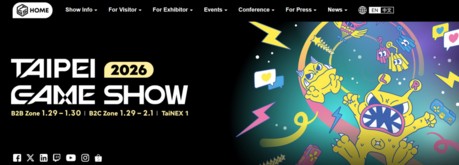[메타X(MetaX)] 지금은 바야흐로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시대다.
글쓰기는 그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다. 몇 줄의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AI는 그럴듯한 서론과 본론, 그리고 깔끔한 결론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낸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훈련받아 작성한 보고서를 보는 듯 정갈하다. 글의 구조는 안정적이고, 문법은 흠잡을 데 없으며, 문장 또한 매끄럽게 흘러간다.
하지만 그런 글을 읽고 나면 묘한 허전함이 남는다. 읽을 때는 분명 이해했고, 눈으로는 내용을 따라갔지만, 책장을 덮고 나면 가슴에 남는 것이 없다. 인상 깊은 장면도, 마음을 울리는 울림도 남지 않는다. 그 공허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글의 본질적 요소인 ‘내 이야기’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글은 단순한 전달물이 아니다. 글은 사람이 남긴 흔적이고, 기억을 불러내는 통로다. 그러나 AI가 쓴 글은 표준화된 교과서처럼 흠잡을 데는 없지만, 동시에 특별히 기억할 것도 없는 글이 된다. 그것이 AI 글쓰기의 본질적 한계다.
프롬프트 글쓰기의 한계
AI가 만들어내는 문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봄 여행의 감상을 써줘”라고 입력하면, 파란 하늘과 따스한 햇살, 벚꽃이 만발한 거리와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동으로 그려진다. “자기계발 글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과 노력의 가치를 설파하는 글이 나란히 등장한다. 어느 주제를 던져도 AI는 빠르게, 그리고 그럴듯하게 문장을 완성한다.
문제는 그 결과물이 지나치게 비슷하다는 데 있다. 같은 프롬프트를 다른 사람이 입력해도, 문장의 흐름이나 강조점은 조금 다를 뿐 결국 비슷한 풍경을 그려낸다. AI가 만든 글은 말하자면 ‘대체 가능한 글’이다. 읽을 때는 부드럽지만, 누가 썼는지 식별되지 않는다. 글쓴이의 체취가 지워진 문장은 곧바로 평균으로 수렴한다.
평균은 언제나 안전하다. 무난하기 때문에 읽을 때 거부감도 없다. 그러나 바로 그 무난함이 문제다. 안전한 글은 쉽게 잊히고, 쉽게 대체된다. 결국 ‘나만의 이야기’가 빠진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 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은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내 이야기가 글의 힘이다
사람들은 왜 여전히 누군가의 글을 찾아 읽을까?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면 검색 엔진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ChatGPT나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수천 개의 문서를 분석해 구조화된 답변을 내놓는다. 정보의 정확성과 속도만 놓고 보면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블로그 글을 읽고, 칼럼에 눈길을 멈추며, 에세이에 감동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 글 속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 있는 경험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글은 데이터가 아닌 ‘맥락’을 담고,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체험’을 담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독자는 공감한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하는 주말은 소중하다”라는 문장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장이다. 하지만 “지난 주말, 열 살 난 아들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미끄러졌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다. 아이가 곧 내 손을 놓고 멀리 떠날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었다”라는 문장은 다르다. 이 경험은 오직 한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고, 그래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글은 결국 개인의 체험에서 힘을 얻는다.
경험이 메시지를 무겁게 한다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수많은 강연자가 무대 위에서 반복한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울림이 없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추상적이고, 누구나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나는 세 번의 창업에 실패했다. 그때마다 통장은 바닥났고, 친구와의 관계도 무너졌다. 그러나 네 번째 도전 끝에 작은 서점을 열었고,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내게는 무엇보다 큰 성공이었다”라는 문장은 다르다.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도 구체적인 경험이 실린 글은 훨씬 더 무겁다. 그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한 인간의 생생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가 글을 오래 남게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상적 교훈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구체적 경험이 담긴 고백은 독자의 가슴에 흔적을 남긴다. 글의 무게는 경험에서 나온다. 경험이 없는 메시지는 공허하고, 경험이 실린 메시지는 독자를 흔든다.
AI 시대에 더 중요한 차별화
AI가 글을 잘 쓸수록, 인간이 써야 할 글의 영역은 오히려 좁아진다. 그러나 그 좁아진 길이야말로 기회의 길이다. 수많은 글이 AI에 의해 쏟아져 나오지만, 그중에서 오래 남는 글은 반드시 ‘인간의 흔적’이 담긴 글이다.
AI는 데이터를 재조합해 글을 만든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살았던 순간, 내가 느낀 감정은 대신 써줄 수 없다. 내가 울었던 이유, 내가 웃었던 장면,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과정은 나만의 글로만 기록될 수 있다. 이 고유함이 곧 인간 글쓰기의 힘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글은 경쟁력을 얻는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경험과 진심이 담긴 글은 시대가 변해도 독자의 마음에 남는다. 글쓰기의 본질적 차별화는 결국 ‘인간만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결국, 글은 자기 자신이다
좋은 글은 기술로만 쓰이지 않는다. 글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내가 보고, 내가 겪고, 내가 깨달은 것이 문장이 된다. 글에는 필연적으로 ‘나’라는 흔적이 남는다.
AI가 대신 써주는 글은 그럴듯한 보고서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글, 시간이 흘러도 다시 찾아 읽히는 글은 언제나 개인의 체험과 흔적이 담긴 글이다. 기술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성의 잔향이 그 글을 붙든다.
내 이야기가 빠진 글은 공장에서 찍어낸 인스턴트 음식과 같다. 먹을 수는 있지만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담은 글은 오래된 가마솥에서 정성껏 끓인 국물처럼 진한 여운을 남긴다. 그것이 글의 본질적 힘이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그래서 글을 쓰려는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글은 내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겪은 구체적 순간을 녹여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은 결코 쓸 수 없는 경험이 담겨 있는가?”라는 질문도 필요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경험과 감정을 글로 옮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겪은 장면과 감정을 독자가 눈앞에서 그릴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 묘사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그 글은 비로소 AI가 대신 써줄 수 없는 글, 인간만이 쓸 수 있는 글이 된다.
AI가 잘 써주는 시대일수록, 인간이 써야 할 글은 더욱 분명해진다. 바로 ‘내 이야기’다. 그것이 글쓰기의 진짜 힘이며, 우리가 AI 시대에도 여전히 글을 써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META-X.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