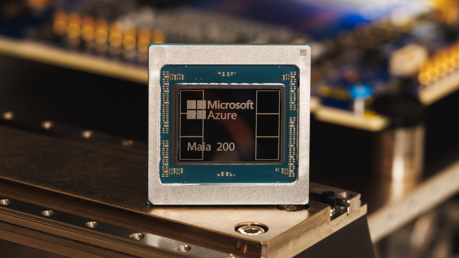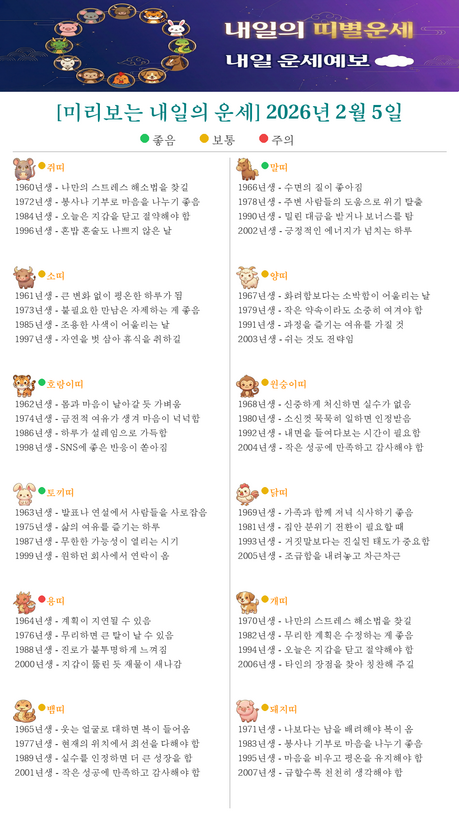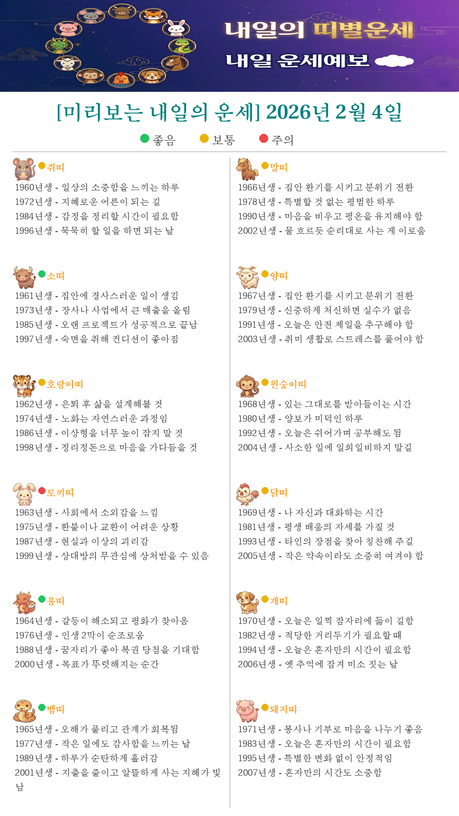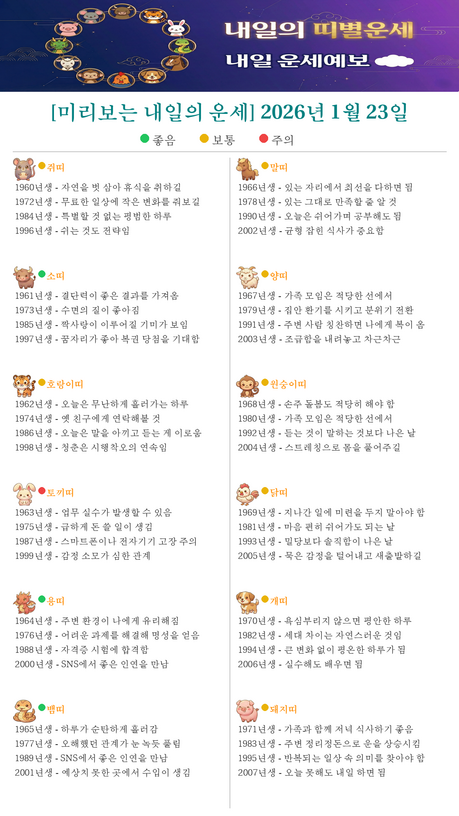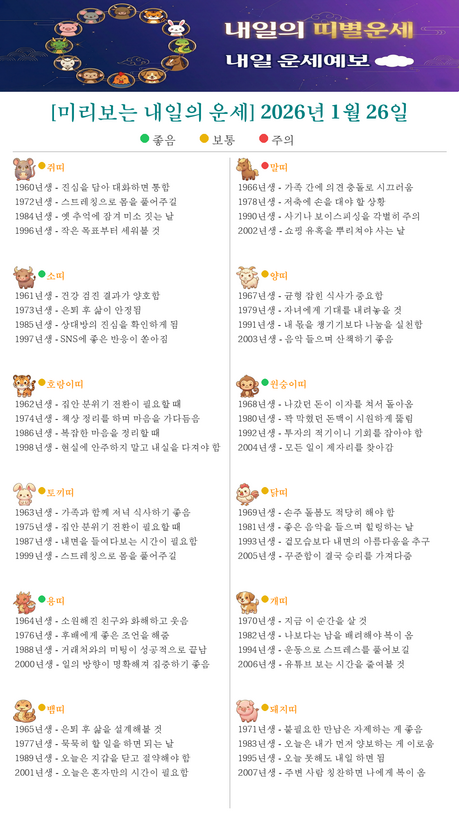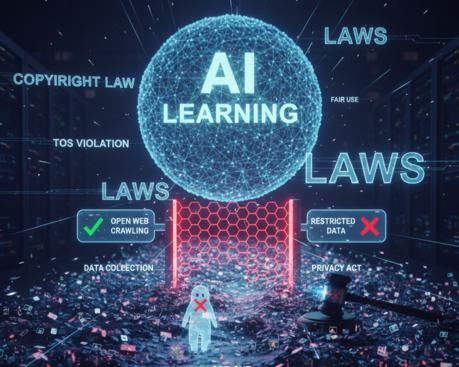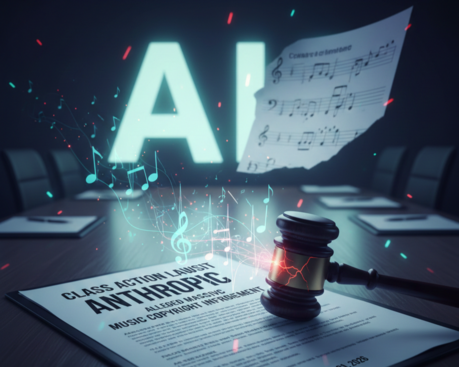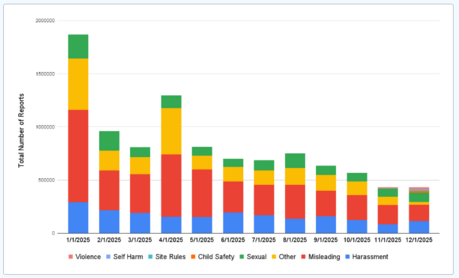[메타X(MetaX)] 미국과 중국의 틱톡 거래를 둘러싼 소식은 매번 요란하게 터져 나왔지만, 정작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늘 불완전했다.
언론은 ‘합의됐다’고 보도했지만, 사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 합의’였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 계약서에 서명한 적은 없었고, 따라서 이른바 틱톡 거래는 공식적으로 성립된 적이 없었다. 백악관은 협상 타결을 낙관적으로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안은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간 뒤 재검토 과정에서 폐기됐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바이트댄스·오라클·월마트 간에 잠정적 합의안이 마련되긴 했다. 하지만 곧 중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틱톡 알고리즘을 ‘수출 제한 기술’로 지정해버린 것이다. 이는 중국이 알고리즘을 단순한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전략 자산,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문제로 본다는 의미였다. 바이트댄스도 미국에 알고리즘을 넘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선언한 것은 정치적 제스처에 가까웠으며, 실질적 법적 효력은 없었다.
여기에 틱톡 금지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복잡하다.

언론에서 흔히 언급하는 ‘네 번째 연기’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지 명령의 집행을 공식적으로 연기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틱톡 측이 제기한 소송과 협상이 맞물리면서, 금지 명령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가 됐다.
결정적으로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불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플랫폼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이 취약했음을 드러냈고, 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가 법원 판결 앞에서 제동이 걸린 순간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틱톡 사건이 의미 없는 해프닝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안은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드러냈다. 틱톡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 주권, 데이터 주권, 그리고 플랫폼 권력을 둘러싼 국제 정치의 최전선이었다.
미국은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 여론 조작에 활용될 수 있다고 의심했다. 이는 단순한 보안 우려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됐다. 플랫폼이 국가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사건은 화웨이 제재와도 닮았다. 미국은 화웨이가 5G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것을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했고, 마찬가지로 틱톡의 알고리즘을 전략 기술로 분류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틱톡 사태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가 ‘디지털 디커플링(Digital Decoupling)’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국가들이 더 이상 기술을 자유로운 시장의 산물로 두지 않고, 자국의 주권과 안보라는 틀 속에서 관리하려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현재 틱톡은 ‘프로젝트 텍사스(Project Texas)’라는 이름으로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 서버에 보관하고, 현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조치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해법은 아니다.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틱톡 퇴출을 요구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틱톡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플랫폼의 생존 여부는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
틱톡 사건이 던진 시사점은 첫째 글로벌 기술 기업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들이 직접 통제하려는 전략적 자원이며, 디지털 주권의 핵심이다. 둘째, 기술 패권 경쟁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 기업의 생존 문제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 전략의 최전선에서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셋째, 세계 인터넷의 미래는 더 이상 하나의 연결된 공간이 아닐 수 있다. 틱톡 사건은 인터넷이 국가별로 쪼개지고, 각국의 규제가 얽혀 새로운 디지털 국경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틱톡은 미국 전용 앱을 운영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퇴출당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글로벌 플랫폼의 단일성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세계 인터넷은 미국형·중국형·유럽형으로 갈라진 디지털 블록 체제 속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
결국 틱톡 거래는 성사되지 못한 ‘원칙적 합의’에 그쳤지만, 그 과정이 던진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틱톡은 단순한 춤추는 영상 앱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 정치와 경제가 얽혀 있는 국제 질서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은 바로 이 작은 앱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인터넷은 여전히 국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점점 더 국가별로 쪼개진 파편의 집합으로 바뀌어갈까.
틱톡은 지금 그 답을 시험하는 무대 위에 서 있다.
[저작권자ⓒ META-X.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