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5일, Meta가 WhatsApp Business Solution Terms(왓츠앱 비즈니스 솔루션 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일반 목적의 인공지능 플랫폼, 대규모 언어모델(LLM), 생성형 AI 챗봇은 WhatsApp 플랫폼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ChatGPT, Claude, Gemini, Copilot, Perplexity와 같은 ‘범용 대화형 AI’가 WhatsApp 위에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메타는 이를 “AI Providers 제한 조항(AI Provider Restrictions)”으로 명문화하며, 위반 시 계정 종료 및 접근권한 철회를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WhatsApp의 비즈니스용 API를 통해 고객상담 챗봇을 운영하던 수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가 대화를 점령한 세계’에서 메타가 내린 역설적 선택
아이러니하게도, WhatsApp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화 데이터를 축적한 플랫폼 중 하나다. 월간 활성 이용자 25억 명, 하루 평균 메시지 1,000억 건 이상. 그 방대한 대화 속에서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자동화된 존재’로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Meta는 이번 개정을 통해 ‘AI가 WhatsApp을 이용해 학습하거나 확산하는 것’을 명확히 차단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구는 주목할 만하다.
“Business Solution Data는 어떠한 형태로든 AI 모델의 개발, 학습, 개선에 사용될 수 없다.”
이는 곧 WhatsApp 대화 데이터가 ChatGPT류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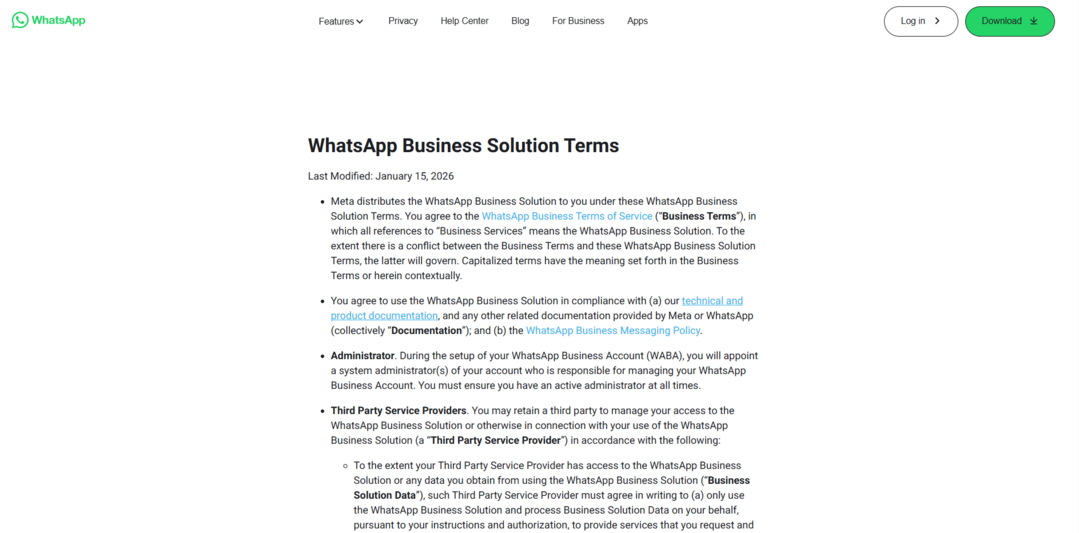
데이터의 주권과 플랫폼의 생존
이번 조치는 단순히 “AI가 너무 강력해져서” 내린 제한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동기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에 있다.
기술적 측면: 생성형 AI의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과 질이다. WhatsApp의 대화 데이터는 인류의 언어·감정·관계를 가장 잘 반영한 ‘금광’이다. 만약 이 데이터가 외부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다면, 메타는 자신이 수집한 최대의 자산을 경쟁자에게 넘겨주는 꼴이 된다.
경제적 측면: 2025년 이후, OpenAI·Anthropic·Google 등은 자사 AI를 각 플랫폼에 통합하며 ‘앱 없는 대화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Meta 입장에서는 WhatsApp이 ‘AI의 하위 인터페이스’로 전락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WhatsApp은 AI의 플랫폼이 아니라, AI의 경쟁자다”라는 선언에 가깝다.
“AI가 대화하고, 인간이 사라지는” 시대의 균열
이번 약관 개정은 단지 기업 간의 데이터 전쟁을 넘어, ‘인간 대화의 주체’를 둘러싼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지난 1년간, 수많은 브랜드들이 WhatsApp API를 활용해 AI 고객상담원(chatbot agent)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Meta는 이번 조항에서 “AI 기술이 서비스의 주 기능이 되는 경우”를 금지했다. 이는 곧, WhatsApp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 남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역설적이다. Meta 자체도 LLaMA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챗봇 ‘Meta AI’를 Facebook, Instagram, WhatsApp에 내장하고 있다. 즉, 타 AI 챗봇은 금지하면서, 자사 AI만을 허용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AI가 만든 대화”가 아니라 “Meta가 통제하는 대화”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AI 접근 제한과 데이터 폐쇄주의의 부상
전문가들은 이번 WhatsApp 약관 개정을 “AI 플랫폼 간의 냉전(cold war)”으로 규정한다. 특히 아래 세 가지 쟁점이 향후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접근 제한의 정당성: Meta는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AI 생태계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시장 보호주의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데이터의 사유화: WhatsApp은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외부 AI 학습에 금지하면서, 사실상 “대화 데이터의 사유재산화”를 선언했다. 이는 오픈데이터 철학과 정면 충돌한다.
AI 챗봇 산업의 타격: 수많은 중소 개발사들이 WhatsApp API를 통해 구축한 AI 상담 시스템은 약관 위반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인도·동남아 지역에서 WhatsApp 기반 비즈니스 챗봇은 주요 고객 접점이었다.
폐쇄에서 개방으로, 혹은 그 반대
OpenAI: ChatGPT API를 모든 메신저·앱에 개방, ‘AI Everywhere’ 전략 추진.
Google: Gemini를 Workspace·Android 전반에 통합.
Apple: iOS 19부터 AI 비서 ‘Apple Intelligence’ 내장, 외부 접속 불가.
Meta (WhatsApp): 외부 AI 차단, 자사 LLaMA 중심의 폐쇄 생태계 구축.
즉, 2026년 AI 플랫폼 경쟁은 ‘열림(Open)’과 ‘닫힘(Closed)’의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WhatsApp의 선택은 ‘닫힌 생태계로의 회귀’이며, 이는 2010년대 애플식 플랫폼 통제 전략의 재현이기도 하다.
“대화의 주인은 누구인가”
향후 몇 년간, 메신저 플랫폼은 ‘AI가 말하는가, 인간이 말하는가’의 경계선을 재정의하게 될 것이다.
Meta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AI 남용을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AI가 배제된 메신저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AI가 인간의 대화를 대신하고, 플랫폼이 이를 독점하려는 지금 —
WhatsApp의 결정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대화의 주권’을 둘러싼 인류의 새로운 논쟁의 서막이다.
대화의 플랫폼에서, 통제의 플랫폼으로
WhatsApp은 오랫동안 “누구와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2026년 1월, 그 자유는 다시 조건을 달았다. 이제 AI는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없다.
결국 이 약관 개정은 기술적 규제가 아니라, “대화를 설계할 권리”를 둘러싼 선언이다.
AI가 인간의 언어를 완벽히 흉내 내는 시대, 플랫폼은 다시 묻는다.
“대화의 주인은, 인간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인가?”
[저작권자ⓒ META-X.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