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구글이 웹 생태계의 향방을 바꿀 만한 발표를 내놨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Privacy Sandbox) 프로젝트의 주요 기술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이 발표는 단순한 기술 조정이 아니다. 구글이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쿠키 없는 광고 생태계’ 실험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한 신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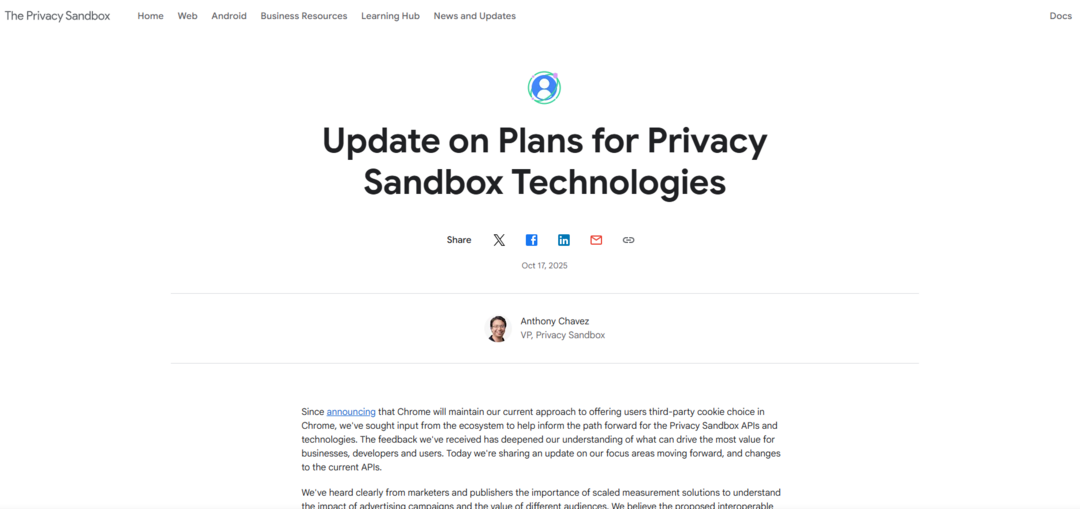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란 무엇이었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구글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다. 목표는 단순했다.
“서드파티 쿠키(3rd Party Cookie)를 없애면서도 광고 산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
즉, 사용자의 웹 활동을 직접 추적하지 않고도 ‘관심사 기반 광고’와 ‘성과 측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대안이었다. 이를 위해 구글은 여러 API를 개발해왔다.
예를 들어:
Topics API: 사용자의 관심사를 브라우저 단위로 분류
Attribution Reporting API: 광고 효과를 개인 식별 없이 측정
Protected Audience: 리타게팅 광고를 브라우저 안에서 수행
Private Aggregation API: 데이터를 개별 식별 없이 집계
이 기술들이 바로 ‘쿠키 이후 시대’의 핵심 기둥이었다.
그런데 구글이 직접 ‘퇴장’을 선언했다
이번 발표에서 구글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
“에코시스템의 피드백과 낮은 도입률을 고려해, 다음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종료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충격적이었다.
Attribution Reporting API
IP Protection
On-Device Personalization
Private Aggregation
Protected Audience
Protected App Signals
Related Website Sets
SelectURL
SDK Runtime
Topics API
즉,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이 정리 대상이 된 것이다.
남는 건 소수의 기초 기술 — CHIPS, FedCM, Private State Tokens 정도뿐이다.
이유는 ‘시장 현실’과 ‘표준화 실패’
겉으로는 “도입률이 낮다”는 이유지만, 내막은 훨씬 복합적이다.
첫째, 광고업계와 퍼블리셔들의 반발이 컸다. 이들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가 “구글의 광고 독점을 강화할 뿐, 산업 전체의 공정 경쟁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둘째, 웹 표준화 과정의 피로감이다.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내 논의는 3년 넘게 이어졌지만, 애플·모질라 등 다른 브라우저 기업들은 “이건 오히려 프라이버시 후퇴”라며 협조하지 않았다.
셋째, 규제 리스크다. EU와 영국의 공정거래 당국(CMA)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가 “광고 데이터의 중앙집중을 강화한다”며 조사를 벌였다.
결국 구글은 ‘프라이버시 보호자’이자 ‘광고 주체’라는 모순에 갇혔다.
대신 구글이 선택한 새 방향
구글은 이번에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1️⃣ “사용자 선택형 쿠키 제도” 유지
→ Chrome 브라우저에서 3rd Party Cookie 차단을 전면 도입하지 않고, 사용자가 쿠키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게 했다.
2️⃣ “범용 광고 측정 표준(Attribution Standard)”로 전환
→ W3C 의 ‘Private Advertising Technology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새로운 웹 표준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구글은 자사 독자 기술 실험에서 ‘업계 공동 표준’으로 후퇴한 셈이다.
“실패인가, 전략적 리셋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실패”로 본다. 5년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대체 기술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다.
이건 “구글식 재정렬(Google Reset)”이라는 평가다. 즉, 불가능한 ‘쿠키 없는 완전 광고 시스템’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프라이버시 선택형 광고 생태계”로 노선을 바꾼 것이다.
‘데이터 중심 AI 광고’로의 이동
흥미로운 점은, 구글이 이번 발표에서 AI 기반 개인화 기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대신 AI 광고 모델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미 구글은 Gemini AI 를 광고 타게팅에 적용하고, AI 기반 ‘Consent Mode V2’를 테스트 중이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사라진 자리에 ‘AI 예측 모델’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비즈니스의 타협점 찾기”
마케터들은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했다.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은 우려한다. “구글이 스스로 ‘프라이버시’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실험을 접는다면, 결국 데이터 권력은 더 강화될 뿐이다.” 실제로 쿠키가 유지되면, 광고 추적과 사용자 프로파일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동의’ 버튼을 누르는 책임만 사용자가 떠안게 된다.
구글의 진짜 고민 — ‘개인정보 보호 vs 광고 매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기술적 실험인 동시에 윤리적 딜레마의 현장이었다.
쿠키를 없애면 개인정보는 보호되지만, 광고 매출이 줄어든다.
쿠키를 남기면 광고는 살아나지만, 사용자 신뢰는 떨어진다.
구글은 결국 그 중간에서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해법을 택했다. 하지만 실상은 광고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소프트한 후퇴’에 가깝다.
‘프라이버시의 다음 전쟁터는 AI’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 논의의 초점은 ‘AI 시대의 데이터 윤리’로 옮겨가고 있다.
AI 모델은 어디까지 사용자의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가?
AI 광고는 쿠키 없이 얼마나 개인화될 수 있는가?
데이터의 ‘익명성’은 정말 가능한가?
이 질문들은 이제 웹 브라우저가 아니라 AI 시스템이 답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끝나지 않았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퇴장은 ‘실패’라기보다 ‘시대 전환’이다. 쿠키를 없애려던 시대에서, 이제는 AI가 프라이버시를 ‘관리’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구글의 발표는 그 서막이다.
“프라이버시를 약속했던 기술이 사라진 자리, 이제 프라이버시를 정의하는 것은 사람도, 쿠키도 아닌 AI의 알고리즘이 될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META-X.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